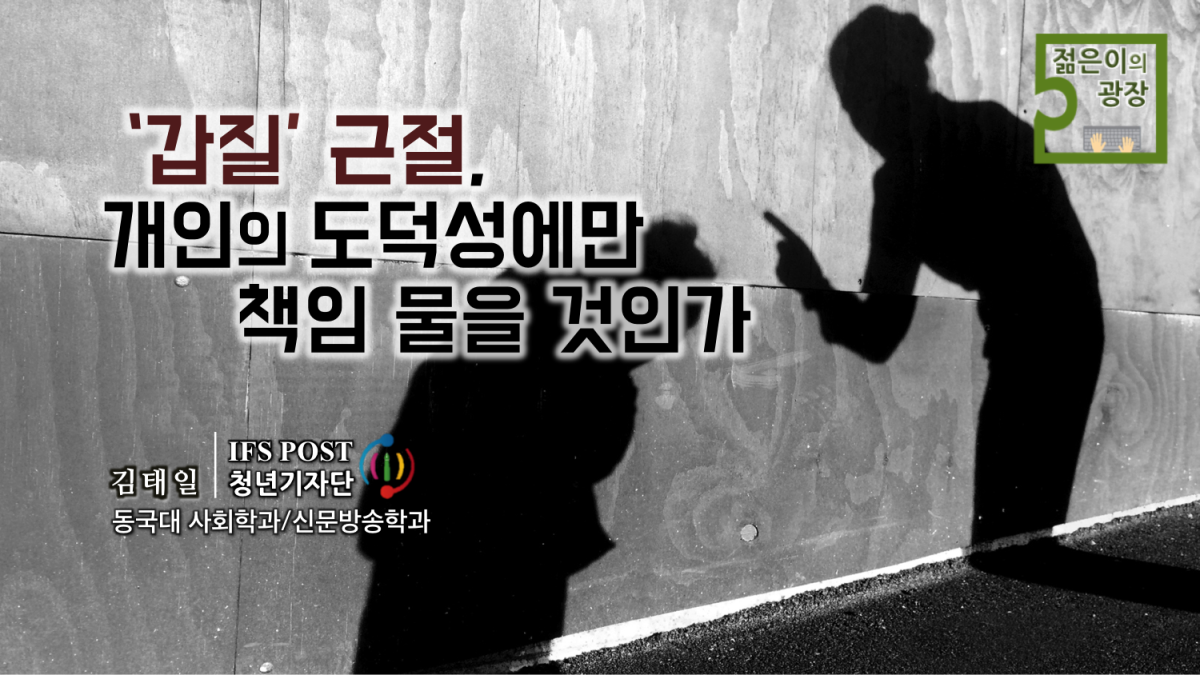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본문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비행기를 돌렸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했고 수백 명의 승객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통영지청(현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뉴스룸에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보복성 인사발령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 장례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이 행위들을 ‘갑(甲)질’이라 부른다. 앞에 ‘권력형’이라는 단어를 더러 붙이기도 하지만, 갑질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대개 어떤 행동을 할 때 몇 단계의 사고(思考)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경제성, 효율성, 타인과의 관계성, 그리고 윤리성. 사회적 인간이라면 이중 무엇 하나가 생략될 경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을수록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몇 단계쯤 건너뛰어도 괜찮았다.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일이 터져도 대중이 잊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바탕과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돈과 권력만 있다면 갑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에 분노해 왔다. “어떻게 인간끼리 이럴 수 있냐”고 질타했다. 적어도 문명사회에서 제어되지 않은 본능은 야만으로 읽힌다. 때문에 시민들은 야만적 행동을 하는 재벌이나 사회 고위층을 보며 분노를 쏟아냈고, 그들은 분노의 대상이 됐음에 마땅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냉정히 고민해볼 문제다. 권력자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하고, 재벌이 총수로 있는 기업이 공정위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겪게 하는 것은 야만의 대가로 충분했는가? 그들이 개인적 고통을 겪었을지언정, 그들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명확한 데 비해 처벌로 인한 사회적 보상은 특정할 수 없다. 특히 갑질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조치나 지원조차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갑질 너머, 구조에 초점을
우리가 갑질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갑질에 대한 조명은 가해자 개인에게 분노를 집중시켜 ‘갑질을 가능케 한 구조’를 은폐시킨다. 은폐의 선두에는 언론이 서 있다. 언론은 갑질의 자극적인 장면만을 내보낸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점찍어 줌에 따라 대중의 관심을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다. 이처럼 가해자인 재벌과 권력자 혹은 개별 기업에 분노가 쏠리면 정작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갑질을 방지할 대책에 대한 논의는 대중의 관심에서 밀려난다. 더군다나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 걸렸다”라며 안심할 뿐이다. 가해자만 바뀐 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결국 구조의 문제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할 것은 권력의 매커니즘이다.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반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다. 권력에 중독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의지를 실현하면서 얻는 쾌락을 갈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상대의 파멸을 지켜보는 과정을 즐긴다. 어쩌면 이런 야만성이 권력의 본질이다. 때문에 갑질의 원인은 가해자의 성격이나 인성의 문제로 환원돼선 안 된다. 그런 인간에게도 권력만 부여된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해진다는 관습적 인식과 구조적 허술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야만 시대의 생존자들,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
지난 14일 홍대 근처 한 소극장에서 진행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현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쓴 <플라이 백(Fly Back)> 출판기념회에 다녀왔다. 그를 비롯해 서지현 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이 참석했고, 변영주 영화감독이 사회자로 등장했다. 모두 우리 사회 굵직한 갑질 사건들의 피해자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 사실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 담담함이 슬펐다. 그들은 또 웃었다. 그 웃음은 “피해를 슬퍼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얘기해 봐요”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가왔다. 서지현 검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박 사무장님과 저는 성별도, 직장도, 피해 내용도 다르지만 피해를 당한 이후의 경험이 똑 닮았어요. 조직 내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의 수순이 매우 유사했죠.”
그들은 조금이나마 미소를 회복했지만,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판단은 법에 맡겨야겠지만, 말과 말의 싸움이 깨끗할 리 없다. 온갖 비방, 폄훼, 협박, 거짓이 난무한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거짓’이다. 최근 ‘가짜뉴스’로도 불린다. 거짓은 암세포 같아서 어디까지 퍼져버린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해자들은 ‘가해’하기를 선택했지만, 피해자들은 ‘피해’당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굳이 법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상식인데 ‘행위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라”거나 “알아서 해라”는 등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비열함의 끝에는 피해자들의 자기 의심만이 남는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닐까.” 공동체가 가장 지양해야 하는 ‘악’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소설에서는 영웅이 나타나 ‘권선징악’의 모티프를 실현시켜주지만, 현실은 소설이 아니다. 선을 권하지는 못하더라도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론 희생도 요구된다. 그러나 그 노력과 희생은 피해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느껴야 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다. 처절한 부끄러움이다. ‘바뀌겠지’라고 생각한 안일함, ‘좀 더 노력해주세요’라는 비열함에 대한 미안함이어야 한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보다 폭력을 바라만보는 방관이 더 큰 폭력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 옆에 있어 줘야할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나쁜 놈들을 몽땅 처벌’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 기사입력 2019년03월22일 17시05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