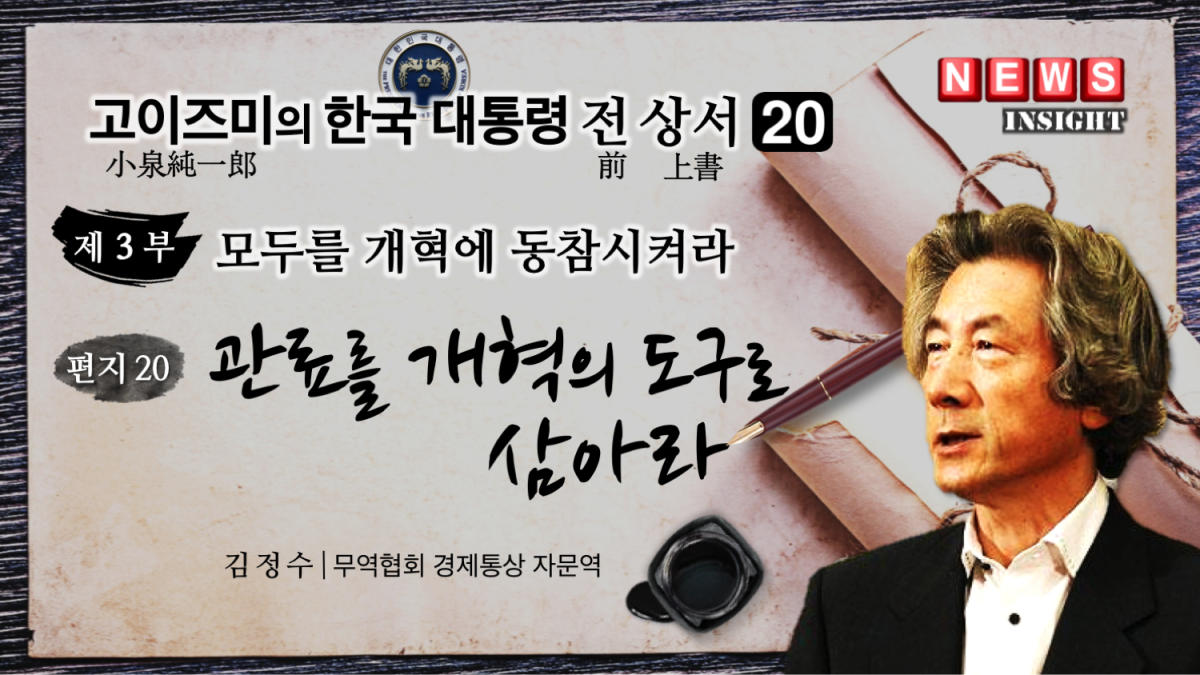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0> 관료를 개혁의 도구로 삼아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5월18일 16시15분
- 최종수정 2017년05월19일 10시14분
관련링크
본문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
<편지 20> 관료를 개혁의 도구로 삼아라
관료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관료는 지도자가 개혁을 추진할 때 활용하는 도구이다. 관료는 개혁추진의 도구로서 개혁에 동참시킬 뿐이다.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지 말라
개혁은 개혁 대상에 맡기지 말라. 개혁의 내용이 조직과 역할의 축소 내지 합리화 또는 새로운 경쟁 참여의 허용 등이면 그 부문이나 조직이 개혁에 저항하기 마련이다. 공공개혁을 공기업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공기업 민영화의 발상이나 추진안 마련을 공기업 임직원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들이 평생 안주해 온 공공부문에 변혁은 원할 수 없다. 행정 개혁을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 개혁안을 마련하는 척 할 뿐 개혁추진은 부지하세월일 것이다.
개혁은, 일차적으로, 개혁을 통해 부문의 이익이나 사익이 아닌 공익이나 국익을 챙길 사람에게 맡겨라.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면,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부문에게 맡겨라. 정 안되면 개혁의 대상이 ‘갑’질을 하는 대상 ‘을’에게 그 개혁을 맡겨라. 규제개혁을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나 관료에게 맡길 게 아니라 규제의 대상인 민간이나 기업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민간경제 개혁은 제도(규제) 개혁으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민간경제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지도자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다. 지도자가 개혁과 그 추진 속도와 강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선도케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개혁이 ‘이끌어’ 내어 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총체적 구조개혁의 시작이자 끝 마무리다.
공공부문, 특히 관료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에 특화된 집단이다. 그들에게 개혁을 맡길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정한 개혁과 전문집단이 마련한 추진계획을 추진하거나 실행하는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 추진의 성패와 그 진척에 대한 책임을 해당 행정조직에게 철저히 물어야 한다. 개혁추진에 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제든 개혁의 기차는 노선에서 벗어나거나 멈추게 된다. 개혁 추진의 책임부서, 추진 속도, 추진 완료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 등을 엄정하게 정한 ‘개혁공정표(改革工程表)’가 쓰임새가 있다.
관료는 위계질서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다. 현재 그들 위계질서의 톱에 있거나 과거에 최고위급에 있었던 인물 중에 당신과 정책이념과 국가 및 경제관을 공유하는 자를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부처와 관료를 통제하고 관리토록 하라. 나는 최우선 개혁과제인 우정민영화를 그런 인물에게 맡겼다. 그는 최고위 직업관료로서 ‘관료의 돈(don)’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에게 어느 관료도 감히 정색을 하고 그가 추진 관리를 책임지는 개혁에 반대하거나 태업을 벌이지 못했다.
관료의 일자리와 밥줄을 쥐라.
낙하산 일자리를 법적으로, 관행으로, 예산으로 원천적으로 없애라. 관료의 ‘안전망’인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면 관료가 총리관저의 의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내각에서 관료 인사는 관료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신조차 고위 및 하급 관료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관료’의 인사는 ‘대신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임기로 보나 인사권 행사로 보나, 관료의 눈에는 총리도, 대신도, 과객일 뿐이다. 그들로서는 ‘철의 삼각형’ 족의원과 관계 부문 또는 지역을 챙기면 그만이었다. 관계 기업은 그들의 낙하산 일자리로서 총리나 대신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철의 삼각형’의 끈끈한 관계가 안겨주는 것이다.
내 내각에서는 주요 관료의 인사는 내각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물론 그 중요한 결정은 총리관저에서 내렸다. 그리고 주요 관료의 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널리 알려지게 했다. 내 내각에서 관료통제 기제로 활용된 것이 내각부의 ‘인사검토회의’였다. 각의의 승인이 필요한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인사에 관한 사안은 인사검토회의(人事檢討會議) 즉 관방장관과 세 명의 부 관방장관에 의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각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집권 2년 차 2002년부터는 국장급 이상 관료를 인사검토회의의 심사대상으로 하던 것을 (총재, 이사장 등) 특수법인의 고위 경영진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들의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관료들로부터 인사권을 박탈하여 관저 아래 두었다. 그 대상은 60개 특수법인이었다. 이 조치가 특수법인 개혁 추진에 일조를 했음은 불문가지다.
우정민영화 추진이 정치적으로 한참 민감할 때 총무성 관료가 반대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자료를 외부로 누출시켰다. 그 관료들이 누구인지 아소 당시 총무대신으로 하여금 신속히 파악하게 한 후, 대신이 그들을 파면하도록 했다. 그 전에도 그후에도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관료를 개혁에 동참시켜라
나는 자문회의나 기타 내각부에 일반부처 출신 관료 중에 진정으로 고이즈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시켰다. 그들은 내 내각에서 일하면서, 관점을 부처 이해로부터 국가 이익으로 바꾸고 자주 부처 이익에 반하는 개혁에도 앞장 섰다. 부처의 이익에서 자유로워진 그들을 사람들은 ‘탈번관료(脫藩官僚 과거 무사가 소속된 번을 떠나 떠돌아 다니는 낭인처럼 되어 버린 관료)’라고 불렀다. 그들을 내가 얼마나 신임하는 지도 제3자가 충분히 알게 했다. 내 내각이 퇴진 후 그들은 저술과 발표 등을 통해, 일본경제의 개혁 후퇴에 감시역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료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관료, 상하조직 안에서의 관료, 내각을 개별 부처들이 지탱하듯(support)하듯 각 부처를 지탱하는 관료, 그들의 속성, 장점과 단점을 꿰어 차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에 움직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겁내는 지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리더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리더의 수족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의존으로, 내각과 부처 등 행정이 그들의 주도 하에 놓일 위험이 크다. 그런 의존을 늘 경계하지 않으면, 관료주도 행정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 .<ifs POST>
<순서> |
- 기사입력 2017년05월18일 16시15분
- 최종수정 2017년05월19일 10시1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