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25 중국 양회, 산업정책 키워드로 AI 제시,
중국의 AI 기술 부상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해야
- 2025년 중국 양회((两会)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제시하며 내수 확대 및 경기부양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표명
- 딥시크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AI+전략’ 추진을 재차 발표하였으며, 특히 AI 기술의 응용과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
- 2025년 양회에서 처음으로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 具身智能)’을 언급하며 AI 기술 경쟁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카, AI 스마트폰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응용산업 육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 향후 제2의 딥시크는 휴머노이드로봇등 제조분야 중심의 AI 응용산업이 될 전망
- 중국 AI 응용산업 생태계 구축과 미·중 AI 기술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및 기술통상 정책 마련 긴요
- AI 기술을 우리 제조업에 적용·확산하여 AI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는하는 등 우리의 강점에 기반한 K-AI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할 필요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2025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A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양회를 통해 산업정책 기조에서 AI를 가장 강조했다. 최근 딥시크(Deepseek)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도 ‘AI+ 전략’추진을 재차 발표하였으며, 특히 AI 기술의 응용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향후,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AI 응용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AI의 글로벌 확장도 예상된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중국 AI 응용산업 생태계 구축과 미·중 AI 기술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2025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AI가 9번 언급되며 지난해 대비 크게 강조
2025년 양회에서 처음으로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 具身智能)’를 언급하며 AI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카, AI PC, AI스마트폰, 지능형 제조장비 등 제조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양회에서는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바이두(百度), 화웨이(华为), 샤오미(小米), 텐센트(腾讯),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 등의 AI 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 확대, 기술 자립,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였다. 2015년 ‘인터넷+’전략으로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주도의 플랫폼경제가 성장했던 것처럼, 향후 ‘AI+전략’으로 Deepseek 등 AI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 될 전망이다.
□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등장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휴머노이드로봇이 등장하였다. 최근 유비테크(UBTECH, 优必选),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 등의 중국 로봇기업들은 대량생산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이치훙치(一汽红旗), 베이징자동차(北汽), 니오(NIO) 공장 등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가동 중이다. 중국 고공로봇산업연구원(高工机器人产业研究所; GGII)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중국은 약 25%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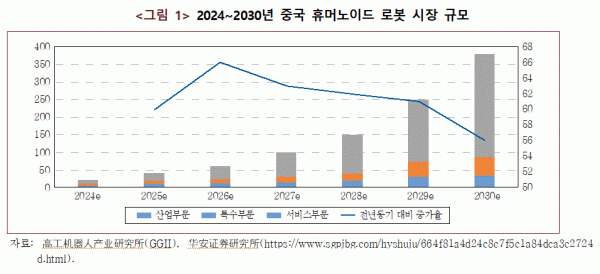
□ 중국 AI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을 염두한 거버넌스 구축 강화 추진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은 3월7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인류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I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人工智能全球治理倡议)' 이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AI 역량 구축 보편화 계획(人工智能能力建设普惠计划)’을 적극 추진하고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오픈 사이언스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등 AI 프로젝트 추진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가들은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딥시크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중국의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AI+ 전략 추진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마련 긴요
우리도 중국과 같이 제조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국가로 결국에는 AI 기술을 우리 제조업에 적용하고, 확산시켜서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AI+ 추진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 특히, 중국이 추월한 전통 제조업,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AI를 통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격차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표준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강점에 집중하여 K-AI 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미·중 AI 블록화에 대응하는 기술통상 전략 마련 필요
AI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독자적 생태계가 구축되고 확장될 경우, AI 국제기술표준, 통상규범(데이터), AI 밸류체인의 글로벌 분업구조 등에서 미중간 블록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등 AI 프로젝트 추진으로 미국도 강도높은 인프라 투자 계획이 추진되면서 미국도 AI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AI기업의 대미투자는 제한될 전망이다.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통해 중국식 AI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산시키는 ‘AI 실크로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우리는 AI 블록화 시대와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2.0 시대에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AI를 적용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에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 하는 등 새로운 투자 및 수출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
<ifsPOST>
※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 3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임 |
- 기사입력 2025년03월30일 17시31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30일 17시3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